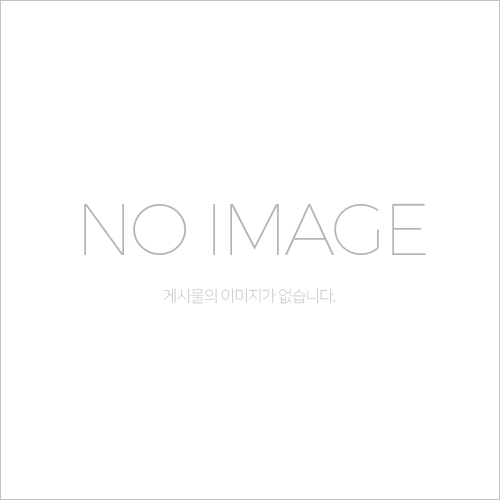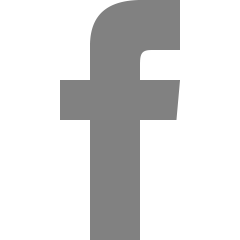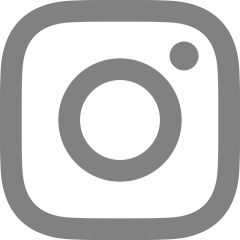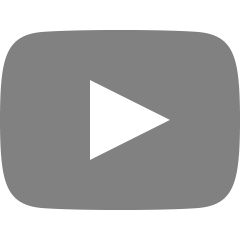옷의 시간들 (김희진 / 자음과모음)
요즘 여행도 연달아 가고 수영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쓰느라 책 읽는데 좀 소홀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집어든 책. 읽은 책이 조금씩 쌓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펜을 잡고 글 쓰게 하는 최초의 원동력은 고통이 아닐까 싶다.
소설이나 그림 등 문화예술의 최초 시작점은 아픔에서 시작하는 과정인게 많았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였다. 작가 스스로의 아픔인지 상상인진 모르지만 여하튼 시작은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털어놓는 데서 시작한다. 그녀를 떠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느끼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는 여자주인공이 존재하지만 그녀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았다. 주인공의 시점이지만 그녀가 상처를 견뎌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 낯선 사건들을 마주하는 시간과 과정 자체가 주인 것 같다랄까.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더 깊이 인지하고 받아들여가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매개체로 세탁기가 등장한다. 세탁기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세탁함과 동시에 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였다. 각자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방에 모여 세탁을 하는 세 여자의 모습을 보면 그저 물건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마도 세탁기는 그들의 사연을 빨래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다. 참 재미있는게 그 사람들 중 남자들은 모두 떠나고 여자들만 남았다. 뭔가 슬펐다. 인연이란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고 말했지만 항상 떠나는 쪽은 남자인 듯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참 수동적이었다.
아픔을 발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녀가 관계의 파열음을 뒤늦게 알아챘을 때 이렇게 변명한다.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상대를 배려하려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해서...이지 않은가. 그 순간의 자신을 버리고 억지 가면을 쓴 댓가.
이 글의 마지막에서 약간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껍질을 깬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작가도 주인공도 좀더 과감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래도 이런 시각은 맘에 든다. 그래,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것도 해결이지.
사람과 사람이 맺어가는 관계라는 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다네. 옷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지. 작아지고 커져서, 혹은 낡아지고 닳아져서 떠나게 돼. 취향과 유행에 맞지 않아서도 떠나게 되고 말이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란 없다네. 관계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야.
봄날에 떠나간 사람보다 봄날처럼 떠나간 사람이 더 아파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나답게 사는 이야기 > 세상을 읽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4년 읽은 책 결산 (0) | 2015.01.01 |
|---|---|
| 1984 (조지 오웰 / 책만드는집) (0) | 2014.12.28 |
| 나를 찾아줘 (길리언 플린 / 푸른숲) (0) | 2014.11.08 |
| Q & A (온다 리쿠 / 비채) (0) | 2014.10.22 |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 북로드) (0) | 2014.10.20 |
| 가짜 우울 (에릭 메이젤 / 마음산책) (0) | 2014.09.27 |
| 고슴도치의 우아함 (뮈리엘 바르베리 / 아르테) (0) | 2014.08.17 |
|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 사계절) (0) | 2014.07.28 |
|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 다산책방) (0) | 2014.07.20 |
|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 문학동네) (0) | 201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