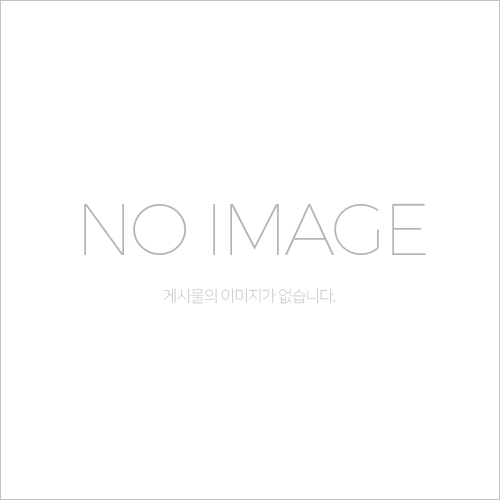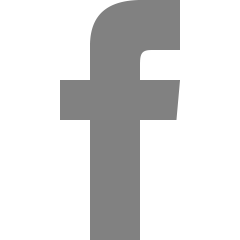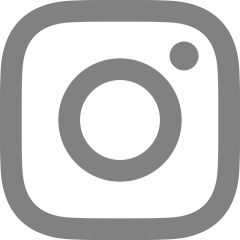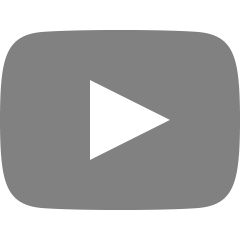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 이매진)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야기바구니같다는 묘한 상상과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이다. 헌책방을 하는 어떤 아저씨의 주무대인 헌책방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다.
행복한 책읽기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책 읽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가까웠다. 책을 집어들면 자신의 추억과 그 책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물 속에서 샘 솟듯 흘러나와 '나 그때 사실은 이랬었지'라고 풀어놓는 듯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나도 그때의 감정과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기분이었다.
특히 대형서점에 가기 위해 한두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다녔다는 얘기를 보면 어린 시절 가끔 차비를 아끼려고 한시간 넘게 걸어다녔던 추억이 되살아났다. 다만 난 서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비로 군것질을 하려고 했었다. 뭐 그래도 내가 책을 안 좋아했다는 건 아니다.
난 내가 어린 시절에 책을 꽤 좋아하고 많이 읽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진 않은 것 같더라고. 다들 읽었다는 책은 잘 보면 은근히 읽지 않은 책이 많다. 게다가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고등학교 때 읽었다니.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이 어려운 책인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책 읽은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다. 아, 이 책은 나도 읽었는데 하기도 하고 저 책에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있었단 말이야? 하기도 한다. 여기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일랜드에 가보고 싶다는 작가의 소망을 엿봤는데 왠지 흐믓하고 그 소망을 꼭 이루셨으면 하고 속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하고 말이다.
나온지 약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책방이 비록 이사는 했지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집에서 꽤 떨어져있고 갈 일이 별로 없는 곳에 위치하다보니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엿보고 싶은 책방이다.
'나답게 사는 이야기 > 세상을 읽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읽은 책 결산 (0) | 2017.01.01 |
|---|---|
| 리스본행 야간열차 (파스칼 메르시어 / 들녁) (0) | 2016.12.20 |
|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 오닐 / 민음사) (0) | 2016.05.17 |
|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 함께북스) (0) | 2016.05.02 |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1) | 2016.04.30 |
| 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 (제레미 머서/시공사) (0) | 2016.04.24 |
|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역.양민종 / 솔) (0) | 2016.04.22 |
| 퀴르발 남작의 성 (최제훈 / 문학과지성사) (0) | 2016.04.21 |
| 2015년 읽은 책 결산 (2) | 2016.01.04 |
| 열등의 계보 (홍준성 / 은행나무) (0) | 201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