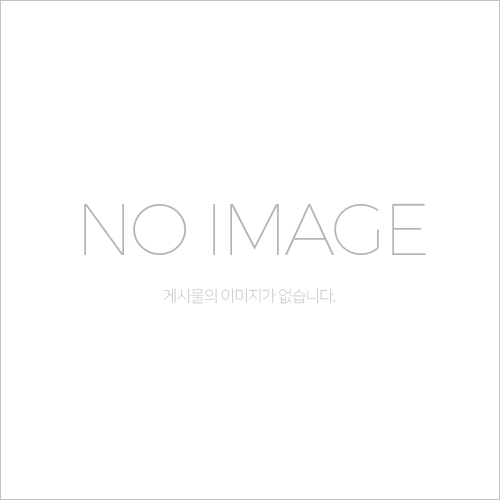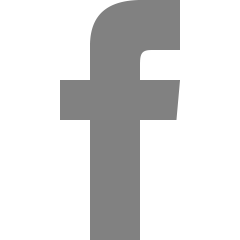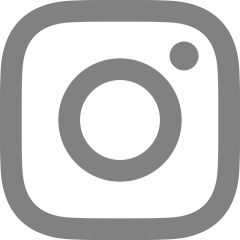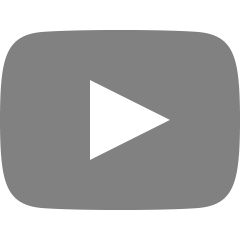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 (제레미 머서/시공사)
유럽여행을 가기 전에 읽어보려던 책이었다. 하지만 여행 전엔 준비하는 데 바빠 전혀 읽지도 못했고 돌아오고 난 뒤에야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집은 건 파리의 유명한 영미문학 전문 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였다. 헤밍웨이 등 위대한 문호들이 거쳐갔고 여러 유명 작가들이 낭독회를 가진다는 그 서점. 무엇보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두 주인공이 9년만에 재회한 그곳이기도 하다. 로맨틱과 낭만의 환상을 품은 내가 이 책을 집은 건 당연한 수순일 수 밖에.
캐나다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저자가 서점에 불시착하여 몇달간 지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서점의 역사와 주인의 역사 그리고 서점에서 살았고 살아갔던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이다. 아니, 서점에서 지낼 수 있었다니. 우와. 그런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냥 낭독회를 좀 하고 작가와의 인터뷰 이런것도 하는 유서깊은 서점이라 생각했지.
게다가 정확히 말하자면 헤밍웨이가 사랑했고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출간했던 그 서점은 아니었다는 것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다. 그때의 서점 주인은 따로 있었고 그 주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사람이 그 이름으로 바꿨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서점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원래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추구하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수집하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그 이름 자체로도 소설이라는 한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작가와 그 안의 사람들 이야기는 뭐랄까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자극적었다. 마약과 대마초, 폭행, 암시장 거래 등등... 이런 것엔 한국인들은 별로 친숙하지 않으니까. 내 눈에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겐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인 듯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꽤 오래전 일인지, 화폐단위가 프랑이었다. 유로가 도입된 지가 언젠데 프랑이라니.
책속에서 이미 아흔인 서점 주인은 이미 세상을 뜨고도 남았을 시점이다. 알아보니 지금은 딸이 그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다. 지금도 그렇게 작가들이 숙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점은 여전히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 서점에서는 온갖 사랑이 만들어지고 부숴지고 다시 빛바랜 색을 더해 그 향기까지 만들어내는 듯하다.
여행 당시 오래 있지 못하고 잠시 앞에서 사진만 찍고 떠났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홍차파티와 낭독회에 참여해보리라 다짐해본다. 일단 영어공부 좀 하고...
'나답게 사는 이야기 > 세상을 읽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리스본행 야간열차 (파스칼 메르시어 / 들녁) (0) | 2016.12.20 |
|---|---|
|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 오닐 / 민음사) (0) | 2016.05.17 |
|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 함께북스) (0) | 2016.05.02 |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1) | 2016.04.30 |
|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 이매진) (0) | 2016.04.28 |
|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역.양민종 / 솔) (0) | 2016.04.22 |
| 퀴르발 남작의 성 (최제훈 / 문학과지성사) (0) | 2016.04.21 |
| 2015년 읽은 책 결산 (2) | 2016.01.04 |
| 열등의 계보 (홍준성 / 은행나무) (0) | 2015.12.23 |
| 옥수동 타이거스 (최지운 / 민음사) (0) | 2015.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