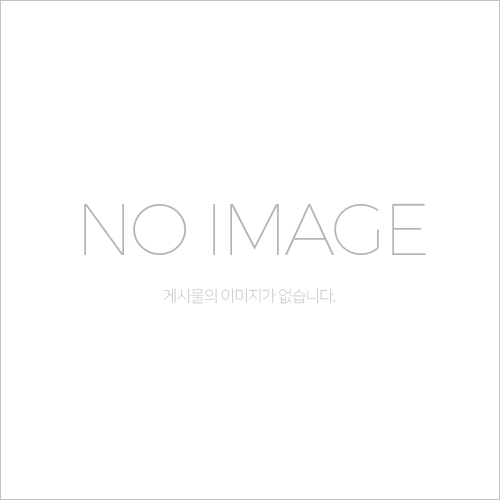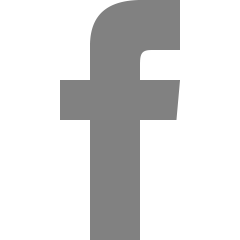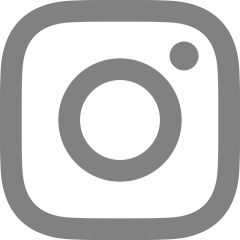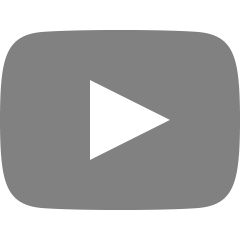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 예담)
책장에 꽂힌 채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이다. 언니가 산 책이었는데 표지가 벨라스케스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어서 강한 호기심을 느꼈었다. (그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많고 검색정보도 많으니 생략하고) 현재까지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이 소설은 오른쪽 아래 못생긴 난장이가 주인공인 양 초점을 맞춘 표지를 사용했다.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은 아니, 표지에 대한 인상은 강렬했지만 난 이 책을 오래도록 읽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꺼내보았다. 사실 이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겐 불필요한 묘사와 감정선이 많았다. 그리고 뭔가 끊어지는 듯한 단락과 독백들. 게다가 페이지수도 상당했다. 읽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서야 겨우 다 읽어냈다.
정말 힘겹게 다 읽고난 지금, 이 책에 대한 느낌을 말하자면 '이건 정말 판타지네!' 원래 소설은 허구라지만 이 책의 그 여자의 성격은 나에겐 그럴 듯 하지 않았다. 소설 속에 등장인물의 삶에 대한 자세와 가치관, 감정들의 묘사, 대화 등등의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배치했지만 불필요할 만큼 많았다. 약간의 환상도 있는 듯 했다. 그건 뭔가를 가리기 위한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추녀에 대한 이미지 묘사가 너무 부족해서 얘가 못생기긴 한건가? 싶을 정도였다.
작가는 못생긴 여자의 캐릭터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사람들이 가지는 내면의 어둠 자체를 별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정말 어둠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처럼 자신의 어둠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그러는지,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내면의 어둠은 무의식중에서 사고와 행동, 언어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그녀처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못생겼어도 어딘가 당당함을 풍긴다. 작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녹여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추녀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작가 본인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역부족이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 그 많은 묘사를 했나 싶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것도 삶이다'라는 말은 캐릭터가 아닌 소설에 그려진 상황만이 나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어쨋거나 마지막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 스스로도 판타지라고 말한다. 왠지 작가도 이 글을 쓰는게 참 험난했을 것 같았다. 나에게 인상깊었던 건 오히려 주인공의 어머니었다. 주인공의 어머니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
더없이 희생을 하면서도 그래서 늘 어머니는 숨거나, 가려진 느낌이었다. 아니 언제나 아버지에게 미안해 한다는 느낌을 나는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이부분에서 갑자기 숨이 컥 막혔다.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미안해했던 나의 지난 날이 떠올라서였다. 나를 향해 쏟는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못된 버릇. 불필요한 자기반성이자 자기학대.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독서일기를 쓰면서 알았다. 아! 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판타지구나. 나중에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 다르게 다가올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갑갑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책이다.
'나답게 사는 이야기 > 세상을 읽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 열린책들) (0) | 2014.06.07 |
|---|---|
|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 더좋은책) (0) | 2014.05.04 |
| 여행의 공간 (우라 가즈야 / 북노마드) (0) | 2014.04.17 |
| 글쓰기 훈련소 (임정섭 / 경향미디어) (1) | 2014.04.15 |
|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 더클래식) (0) | 2014.04.12 |
|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케이트 디카밀로 / 비룡소) (0) | 2014.04.05 |
| 밀리언 달러 티켓 (리처드 파크 코독 / 마젤란) (0) | 2014.04.04 |
| 책인시공 (정수복 / 문학동네) (0) | 2014.04.01 |
|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김혜남 / 갤리온) (0) | 2014.03.30 |
| 밤의 피크닉 (온다 리쿠 / 북폴리오) (0) | 2014.03.23 |